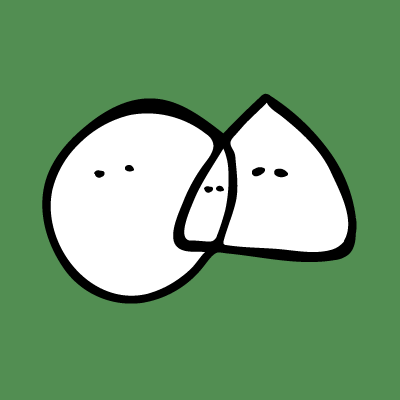『하루키는 이렇게 쓴다』 라는 책을 오늘 빌려서 읽기 시작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쓰기 규칙 47개를 정리한 내용인데, 여기에 제목을 강렬한 단어로 특이하고 길게 지으라는 말이 있어서 써봤다. 지루하다. 회사. 소확행. 외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쓰면 정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언뜻 어그로 끄는 것 같지만, 그래도 “책에서 배운대로” 해보았다.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그래도 반은 성공한 셈일 것 같다. (아직 순방문자가 없는 건 비밀이지만 말이다. 어디 홍보라도 해야할까 싶다.)
새해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루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을까. 특히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생기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 입사한 첫 해, 아니 첫 반 년 동안은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스템에 눈알이 뒤집혀서 아무도 시키지 않는 야근도 하고 했지만, 벌써 5년차에 접어든 지금은 누구보다도 칼퇴하는 “어엿한” 직장인이다. 영업이나 고객지원 같은 회사 바깥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무나, 기획부나 마케팅 같은 업무가 많아 보이는 부서들은 종종 야근을 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단지 연구소 중에서도 SW를 만드는 나부랭이고, SW는 우리 회사에서 큰 역할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다. 앞으로 세상이 SW 위주로 바뀌다보니, 회사에서도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큰 체감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루한 5년을 보내면서, 그나마 회사 생활 중에 소확행이 있다면 나는 외근을 꼽는다. 회사 바깥 사람들을 상대할 일이 많지 않기도 하고 SW 문제는 굳이 고객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근을 나가는 경우가 잘 없다. 그럼에도 내가 속한 팀은 꽤 신제품을 만들다 보니, 외부 전문가를 인터뷰하러 가거나 경쟁사 장비를 구경하거나, 세미나 등을 듣기 위해 외근을 가는 경우가 가끔 생기고 있다. 오늘도 그런 외근 중에 하나였다.
내가 외근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외근을 가는지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외근을 나갈 때의 나의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 제목에서 말했다시피 지루한 일상 가운데의 소소한 재미이다. 평소의 나라면 절대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혹을 가지 못 했을 곳을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다. 비단 외근의 목적이 되는 고객사나 연구소 등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길. 특히 걷는 길이 중간에 있으면 더욱 좋다. 다같이 회사 차를 타고 외근을 갈 때면, 걷지 못해 아쉬울 정도다.
외근 가는 날 날씨가 좋으면 더 좋다. 왜냐, 당연히 걷기 더 좋으니까. 걸으면서 주변의 경치를 둘러보면 뭔가 회사에서 도망친 것 같고, 해방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낮시간에 밖에 나와있을 때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주인이 출근해서 낮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던 강아지가, 주말 낮에 산책을 나가면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 나에게 외근은 그런 거다. 사무실에서 모니터만 쳐다보며 풀죽어 가고 있다가, 바깥 공기 마시러 산책 가는 것. 오늘도 그런 외근이었다.
최근에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강 근처에 있어서 걸을 때 느낌이 아주 좋다. 일단 지하철을 내려 역을 빠져나왔을 때, 벌써부터 한적한 느낌. 살짝 외진 곳에 있다보니 널찍널찍하게 길이 되어 있어서 햇빛을 보기가 좋다. 그리고 가는 길엔 작은 강을 건너는데, 이곳의 경치가 좋다. 물이 흐르고, 나무와 풀이 자라고 새들도 쉬는 그런 곳이다. 아쉽게도 오늘은 사진을 안 찍어서, 예전 사진으로 대체 해본다. 2020년 9월의 사진인데, 아직 여름의 끝무렵 그리고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을 때다. 푸릇푸릇한 게 남아 있어서 너무 예뻤다.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이유가 초록이 주는 에너지 때문인데, 그 초록의 힘이 가득 느껴졌다. 내가 초록을 좋아하는 이유.

하지만 초록만 예쁜 건 또 아니다. 한 겨울에도 나름의 풍경이 있다. 한 겨울 눈이 왔을 땐 주변이 온통 하얀색이었다. 게다가 아침 일찍 9시쯤 가다보니, 아직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새 눈이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그 눈을 밞으며 뽀드득 소리를 들으면, 자연스레 힐링이 되는 기분이다. 어릴 적 아파트 마당에 함박눈이 오면 동생이랑 나가서 눈사람 만들고, 눈 싸움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나이 삼십 먹고 눈 오면 그런 생각한다는 것에 누구는 아직도 애 같다는 소릴 할 수도 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눈보고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린다고 한다고 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난 현역으로 가지 않아서인지 아직 눈에 대한 이상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다.
일 하러 가면서 이런 풍경을 보고 즐길 수 있다는 게, 일도 일이지만 한 편으로는 소소한 행복 아닐까. 사무실에 갇혀 업무에 시달리다 자유로운 공기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큰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말이다. 괜히 업무 시간에 노는 느낌도 들고 말이다. 하지만, 난 엄밀히 따지면 일하는 중이니까. 외근지에 가는 길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노동 관련 교육에서 들었다. 용두사미인 것 같지만,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쳐야할 것 같다. 사실 “외근 가는 길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생각을 안 하고 글을 쓰다보니 이렇게 됐다. 다음엔 좀 내용 정리를 하고 글을 써야겠다. 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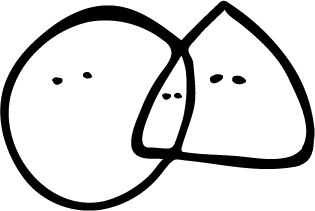 minbeau
minbeau